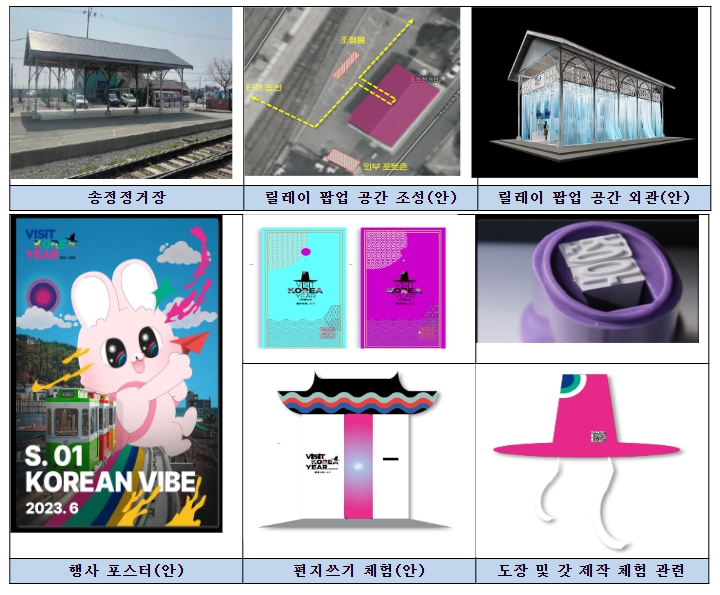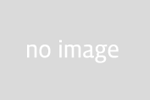풍경처럼 썰렁한 산골 교회의 종소리는 엄마 품처럼 안온하다.
그 소리의 잔향은 일상에 찌든 농민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며, 잠을 깨우는 새벽의 첫 신호이다. 새벽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을 나서는 아버지는 귀농하는 사람들로 인해 교회 식구가 늘었다며 연신 웃음이 넘친다. 그들과 이웃이 돼 영농기술을 전수해주시는 하면 자연과 뭇 생명의 순환원리를 깨닫게 해 정착을 도와주시는 일에 보람을 느끼시는 모양이다.
필자의 아버지는 봄에 내리는 비를 `귀한 손님`이라 한다. 그것은 비가 내려야 만이 땅을 일구고 파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. 그래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"손님이 와야지"라고 노래하시던 기억이 아련하다.
예나 지금이나 농부의 하루는 잠시도 쉴 틈이 없다. 새벽 별을 보고 들판에 나가 집으로 돌아올 때도 역시 별이 보인다.
그래도 살림살이는 늘 곤궁하다. 스무 마지기의 농사를 지으려면 식구들이 합심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쉼 없이 일을 해야 한다. 그럼에도 농가의 수입은 지방 관리 한 사람보다 못하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. 비가 내리면 쉴 것 같지만 농사일 때문에 미뤄두었었던 집안일이 한두 가지 아니다. 병든 몸이지만 움직여야 만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.
조선 후기 이덕무(李德懋ㆍ1741~1793년)의 시(詩)를 보면 농부의 고달픔을 이해할 수 있다.
농부의 별은 새벽녘 공중에서 반짝이고
안개 뚫고 서리 맞으며 동편 논으로 나간다
시고 짠 세상맛은 긴 가난 탓에 실컷 맛보았고
냉대와 환대는 오랜 객지 생활에서 뼈저리게 겪었지
부모님 늙었으니 천한 일을 마다하랴
재주가 모자라니 육체노농하기 딱 어울린다
경략(景(略)의 달변이 없으니 이를 문질러 잡으랴
온화한 낯빛으로 촌 노인네 마주해야지
조선 후기의 실학자 청장관(靑莊館) 이덕무가 20대 후반의 어느 해 석양이 질 무렵 황량한 논두렁 위에서 쓴 시라고 전해진다.
충청도 천안에 소유한 논에서 그는 해마다 벼 열섬씩 수확해 고만고만 생활을 꾸렸다. 그리 힘든 것도 없으련만 새벽같이 일 나가면 이런저런 감회가 밑도 끝도 없이 일어났던 것이다. 가난뱅이라서 시고 짠 세상맛도 실컷 겪고, 객지에서 남들의 냉대와 무시도 뼈저리게 겪었다며 소회한다.
불쑥 인생의 고달픔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간다. 그래도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다행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. 불평 없이 몸을 움직여 일을 해야지 아무래도 서울 샌님의 몸으로 익숙하지 않은 농사일을 하고, 낯이 선 농부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이다.
부모님이 늙으셨으니 천한 일을 마다할 수 없다는 그의 효심이 지극함을 추정해 볼 수 있다. 그는 스스로 재주가 모자라 육체노동이 딱 어울린다고 해 겸손 미가 보인다. 먼동 트는 논두렁 길을 걸어가는 우수(憂愁)띤 초보 농사꾼 선비의 서툰 몸놀림이 한 편의 서정시(敍情詩)처럼 상상된다. 봄이 돼 개구리 우는소리 들으며 소를 몰며 쟁기로 논을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보면 힘에 겨운 소를 어르고 달래는 소리이며,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농부의 애환이다.
시골에서 자란 필자는 할아버지, 할머니, 그리고 온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지으며 빠듯하게 살아왔는지 내 눈으로 봐 온 터이다. 농촌하면 새벽부터 별이 노래하는 밤에까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논밭을 갈고 김을 매느라 고생하던 부모님, 동네 분들의 검게 그을린 피부며 심하게 굽은 허리가 먼저 생각난다.
비가 안 내려도 걱정, 비가 많이 내려도 걱정, 풍년이 지면 수확량이 많아 농산물 값이 내려 걱정, 흉년이 지면 수확량이 적어 걱정,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. 오죽하면 농작물은 농군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고 했을까? 그만큼 정성과 손발이 많이 닿아야 한다는 것이다.
그나마 농기구가 발달해서 예전처럼 힘들지만은 않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농사짓는 일이다. "쌀 한 톨을 얻기 까지는 혼을 바치는 듯해야 된다"고 한 아버지의 말을 되새겨보니 이해가 된다.
편리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던 도시인들은 농사일을 며칠만 해도 몸살이 날 것인즉,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낭만이나 전원생활로 여긴 채 입버릇처럼 나이 들면 농촌에 내려가 농사지으며 살겠다고 하니 웃음이 절로 나온다.
그러니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최고 훈장감이며, 땅은 생명의 근원이며 고향과 같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.